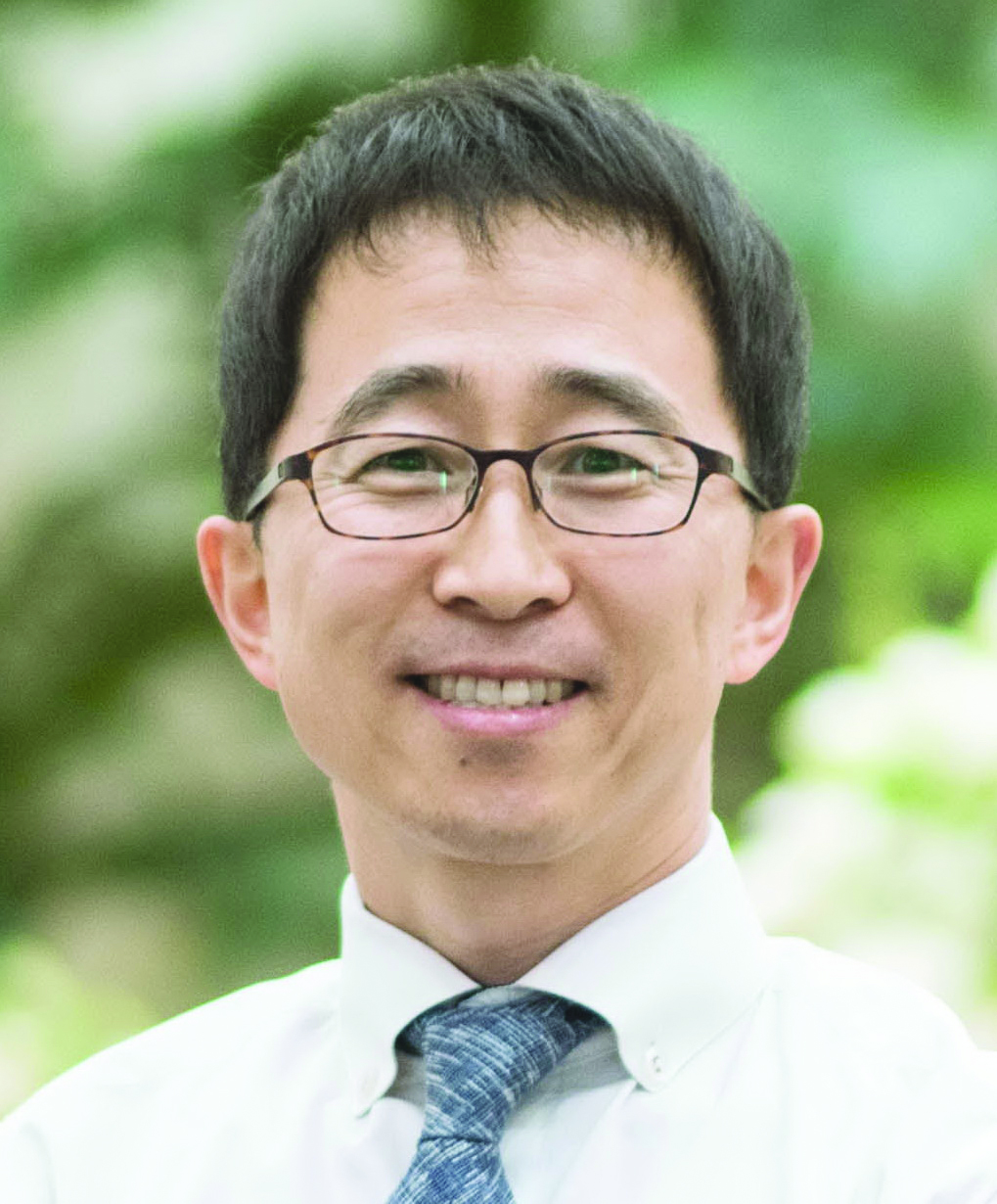손태환 목사(시카고기쁨의교회 담임)
“우리가 세상에 뭐하려고 왔나? / 얼굴 하나 볼라고 왔지”
함석헌 선생의 시 <얼굴>의 일부다. 과장스러워 보이지만, 곱씹어 보면 참말이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얼굴색이 변한다. 하나님의 진단은 선명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창4:7).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얼굴을 돌린다. 안색이 바뀐다. 안면몰수다. 헤어지는 사이에 던지는 마지막 말, ‘우리 이제 얼굴 보지 말자.’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화해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 형제의 재회 장면이리라. 형의 얼굴을 피해 살다가 22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형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다. 예물을 앞서 보내고 난 후 대면하면 좀 나을까 염려한다. 그 사이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와의 싸움!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이라 한다. 마침내 형을 만난 그의 고백은 의미심장하다. “내가 형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창33:10).
결국 화해는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다.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다. 남북의 분단 현실을 요약하면, 형제끼리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흘러간 74년이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흔한 현상은 상대 얼굴에 대한 막연한 공포 혹은 악마화(demonize)이다. 어릴 적 만화영화 <똘이장군>에서 북한 사람들의 얼굴은 다 늑대로 묘사되어 있었다. 상대의 얼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없었던 시절이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얼굴은 모든 윤리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한다. 타인의 얼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모든 윤리적 가치 실현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유학시절, 수업 시간에 투명인간이 된 기분을 종종 느끼곤 했다. 분명 거기 존재해 있었지만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경험, 그건 마치 얼굴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결국 인종주의(Racism)는 상대의 얼굴을 정직하게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2010년 9월 충남 당진에서 20대 청년이 한 철강 회사에서 발을 헛디뎌서 용광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용광로에는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이 들어 있어 숨진 이의 주검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 신문 기사에 제페토라는 이름의 누리꾼이 댓글 형식의 시를 달았다.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 제페토, <그 쇳물 쓰지 마라>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산다는 건, 이 시가 말하듯, 누군가의 얼굴을 되살려 놓는 일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아픈 이들의 얼굴을 살려내는 일이며, 누군가에 의해 뒤틀린 얼굴을 되돌리고, 없는 존재 취급받는 이웃들의 얼굴을 살려내는 일이다. 무엇보다,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 얼굴 좀 보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