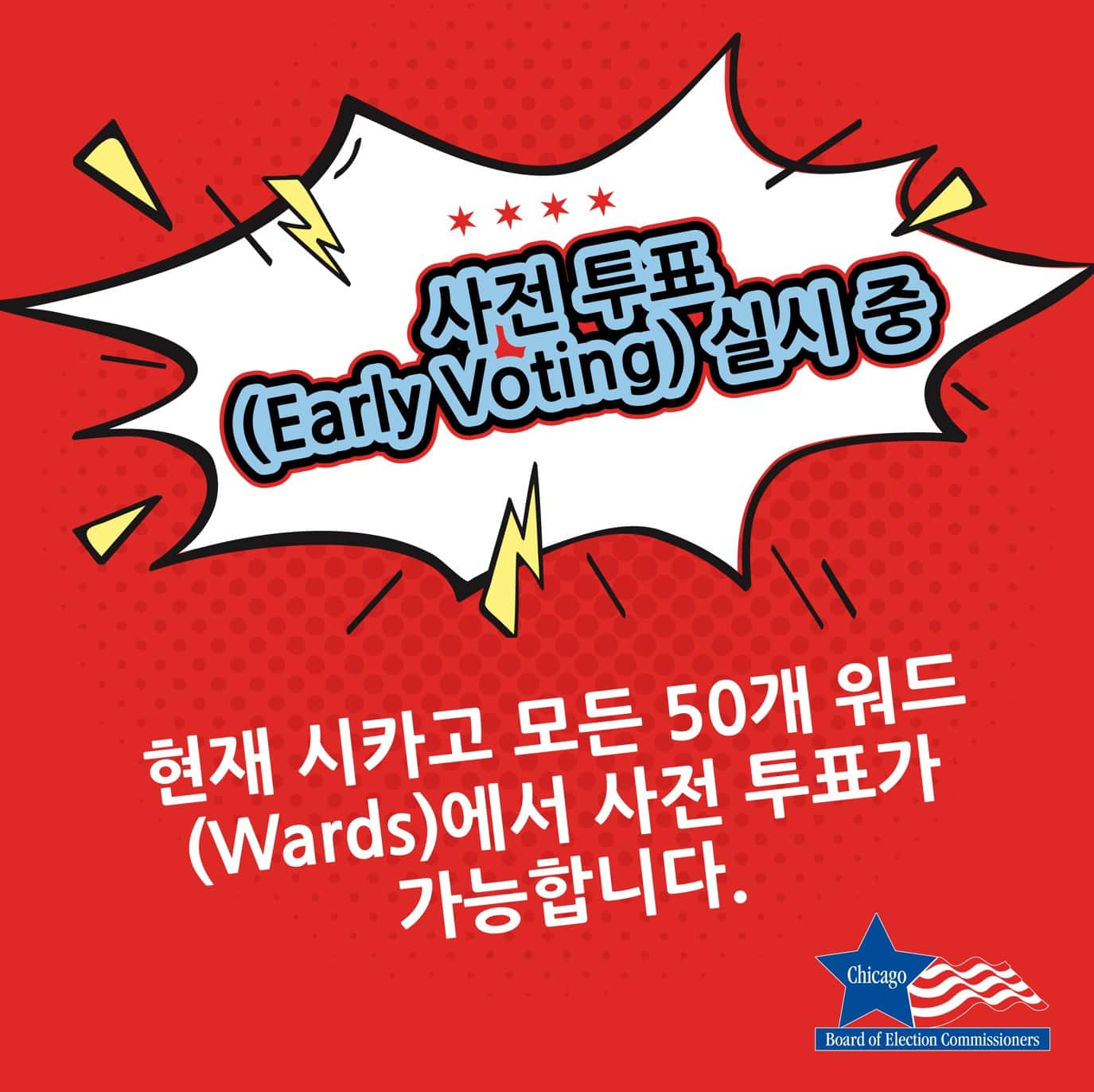▶ “신입 채용 대신 AI로”
▶ 전미경제학회 충격 경고
▶ “문과 전문직도 위험 진단”
▶ ‘AI 활용 능력’ 필수조건
인공지능(AI) 확산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컴퓨터사이언스 전공자들은 물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의 일자리까지 잠식하는 트렌드가 급격해져, AI는 더 이상 사무 보조가 아니라, 전문직을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지난 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에서 윌리엄 비치 전 연방 노동통계국장은 “앞으로 법조계를 진로로 택해선 안 된다”며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다. 그는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신 AI에 법률 리서치를 맡기고 있다”며 “의회 예산 분석조차 이미 AI가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엔 AI가 전문직을 어떻게 대체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석학들은 미국 노동시장이 ‘채용(Hiring)’에서 ‘대체(Replacement)’로 넘어가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입을 모았다. 비치 전 국장은 그 근거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업계를 들었다. 경기 침체도 아닌데 기업 생산성은 10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신규 채용은 20만 명 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코딩, 설계, 법률 리서치 같은 핵심 업무를 AI에 맡기면서 고용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한다. 링크드인 실시간 이력서 데이터 분석 결과, 한때 ‘취업 보증수표’로 불리던 컴퓨터사이언스(CS) 전공자의 2023~2024년 취업 성과는 급락해 역사·철학 전공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리사 칸 로체스터대 교수는 “빅테크가 채용을 멈추면서 이공계 인재가 하향 지원을 하고, 인문계는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안 미국에서 ‘꿈의 전공’으로 불리며 억대 연봉의 지름길로 여겨졌던 컴퓨터 관련 전공이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경기 둔화 여파로 심각한 구직난에 직면해 있는 현상은 지난해 이미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NYT는 실리콘밸리 문화 속에서 자라며 “코딩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확신으로 대학에 진학한 수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 일자리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UC 버클리 컴퓨터사이언스 학과의 제임스 오브라이언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당시 테크 전공 학생들의 취업난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인용하며 “심지어 GPA가 4.0인 최우수 학생들도 일자리 제안을 못 받고 있다”며 “하이텍 취업 시장이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AI의 영향은 화이트칼라에 그치지 않는다. 마이클 호리건 전 노동통계국 부국장은 “저숙련 노동자에게 AI와 로봇은 완전한 대체재”라며 “공장 자동화와 물류 로봇 도입으로 단순 노무직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졸 이상 고용은 늘었지만, 고졸 이하 고용은 감소세를 보였다.
임금 충격도 예외가 아니다. 로버트 시먼스 뉴욕대 교수는 “AI 도입 초기 프리랜서 작가의 임금은 10% 이상 감소하고, 확산 단계에선 영업·마케팅 직군 임금도 9%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AI를 거부하기보다, 활용 능력을 키운 개인과 조직만이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 “AI로 인해 새롭게 가능해진 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처럼, 노동시장은 이미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